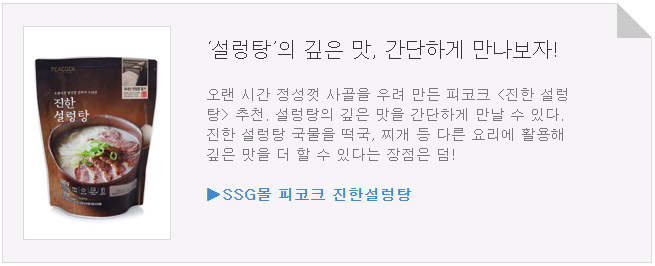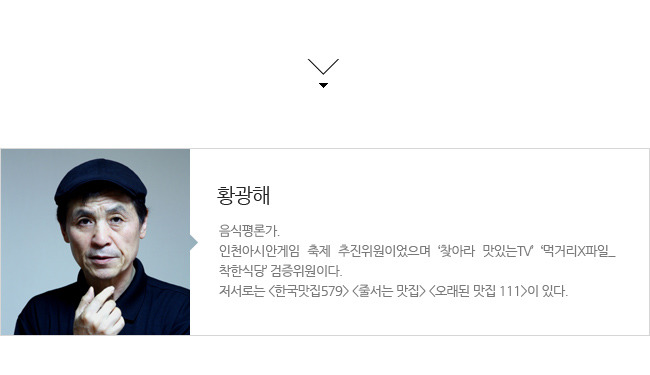음식과 블로그의 공통점. 만드는 이들이 힘들이면 보는 이들은 쉽고, 만드는 이들이 고생해서 어렵게 만들면 보는 이들은 재미있고!! 신세계그룹의 SSG블로그. 힘들여 정성스럽게 만드니, 必 대박!! 쉽고 재미있고!!
– 음식칼럼리스트, 황광해
설렁탕 집에서 자주 발견되는 “임금께서 선농단(先農壇)에서 쇠고깃국을 끓여서 백성들과 자주 나눠 먹었다. 그게 설렁탕의 시작이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농단에 갔다가 비를 만나면 급히 환궁(還宮)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시 쇠고기는 귀했고 그릇도 귀했습니다. 탕을 끓여 먹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설렁탕은 최소 10시간 이상 고아야 합니다. 실제 설렁탕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입니다.
설렁탕의 실제 기원

‘이문설렁탕’은 우리나라 최고(最古), 즉 가장 오래된 식당입니다. 1904년 무렵 문을 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문(里門) 부근에 있는 설렁탕 집’이니 ‘이문집’이라 불리다가 ‘이문옥里門屋’이 되었고, 지금의 ‘이문설렁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1897-1910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설렁탕은 ‘저잣거리 서민들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문설렁탕이나 해장국집 ‘청진옥’에는 나무꾼들이 주요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동소문을 거쳐서 땔감을 한양(경성)으로 져 날랐던 나무꾼들은 땔감을 부려놓고 설렁탕 한 그릇으로 주린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서민의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 기록도 변변치 않습니다.
한식의 기본은 탕반음식입니다. 국(양)과 밥(음)이 밥상의 주인공인 것이죠. 나물국이든 고깃국물이든 늘 밥과 더불어 국이 한 그릇 놓여야 합니다. 반가(班家)나 상민(常民) 구분 없이 밥상의 주인공은 탕반(湯飯)입니다. 저잣거리 서민들의 음식인 설렁탕은 어느 날 기록에 나타나면서 그 시작이 명시된 음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 음식도 아니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주막 등에서 편하게 끓였던 여러 종류의 국물 중 하나였죠. 그것이 일제강점기 무렵, 주막에서 내놓는 설렁탕이 된 것입니다.
서민들이 먹던 진짜 설렁탕은 어떤 모습이었나?

조선은 ‘3금(三禁)의 나라’였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늘 금송(禁松)을 지켰습니다. 누룩을 만들거나 곡물로 술을 빚고 마시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른바 금주령(禁酒令)을 어기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소는 중요한 농사 도구이죠. 그래서 (금육禁肉)은 영조 시절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진 금기입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청나라의 ‘쇠고기 먹는 법’이 전해지면서 조선의 궁궐부터 쇠고기 소비가 늘어납니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쇠고기를 먹자고 하자 신하들이 “상(上=임금)께서는 금육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드신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조도 늦은 밤 규장각의 신하들과 난로회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쇠고기 소비는 일제강점기에 다시 한 번 증가합니다. 조선을 지탱하던 ‘금육’도 풀렸죠.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 쇠고기 부산물로 끓이는 설렁탕, 설렁탕과 닮은 음식이 유행하기 마련입니다. 살코기는 정육(精肉)입니다. 정육은 귀하게 쓰고 서민들은 구하기 쉬운 나머지 부산물로 길거리 음식인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8월 24일 동아일보의 ‘평양인상’이라는 기사에는 설렁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전략) (서울)설렁탕은 뿔만 빼놓고 소고기란 모조리 휩쓸어 넣고 끓이는 국입니다만, 이곳 명물은 모든 잡고기는 다 제쳐놓고 그중에 혹살, 혓바닥, 우량 우신 등을 비롯하여 그중에 맛있고 연한 것만 넣고 끓이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서울 설렁탕같이 기름지지는 못할망정,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설렁탕같이 쇠털 내음새(냄새)는 조금도 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값은 서울 설렁탕보다 쌉니다. 한 그릇에 십 전씩입니다. 맹물에는 밥도 넣거니와 밀국수도 섞어 넣어줍니다. (후략)”
서울의 대표 설렁탕 맛집

설렁탕은 “모든 식재료를 귀하게 사용”하는 한식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음식입니다. 설렁탕처럼 사골과 잡뼈, 머리뼈와 각종 부산물까지 사용하여 탕을 끓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제강점기 설렁탕에는 반드시 지라(만하 혹은 마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장도 모두 사용했다는 뜻이죠. 오늘날도 잘 끓인 설렁탕은 굵고 가는 한우 뼈, 양지 등 살코기 부분, 도가니, 각종 부산물 등을 모두 넣고 오랜 시간 잘 고아낸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이문설렁탕’은 이사를 한 후 국물이 더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전통 설렁탕에 가까운 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곡동 ‘하영호신촌설렁탕’은 고소한 곡물 냄새가 나는 설렁탕 국물을 내고 있습니다. 장인의 솜씨로 곤 국물이죠. 공덕동 로터리 부근의 ‘마포양지설렁탕’, 왕십리 언저리 ‘홍익진국설렁탕’ 등도 추천할 만합니다. 서소문 언저리 ‘잼배옥’, 종로3가 ‘영춘옥’, 신설동 ‘옥천옥’ 등도 대대로 이어져 오는 맛집입니다.